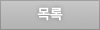원색의 산조
-이현 전시회 ‘지중해의 빛 - 환幻’에 부쳐
시인 황인숙 이현의 작업실에 놀러 가면 접대의 마무리로 스위트바질 차가 나온다. 갖가지 허브 화분들로 밭을 이룬 베란다에 이끌려가 허브 하나하나를 소개 받은 뒤, 스위트바질 잎을 똑똑 따서 손바닥에 소복이 모으는 의식에 끼었다면, 그것은 이현이 당신을 마음에 들였다는 뜻이다. 투명한 유리잔 속, 스위트바질 잎이 뜨거운 물속에서 더욱 진한 녹색으로 생생해진다. 깨끗하고 따뜻하다. 싱그럽고 달콤한 향미가 혀에 감긴다. 향이나 맛은 사람마다 체험에 따라 달리 느껴서, 그 감상으로 삶의 이력을 알 수 있다. 매일 마신다면서도 새라 새롭다는 듯 “너~무 좋아!” 감탄한 뒤, 이현은 스위트바질 차맛을 이렇게 읊는다. “초록색 민트와 분홍 스위트” 운도 딱딱 맞고, 화가란 과연 색채의 시인!
이현은 일상과 꿈과 예술의 경계가 없이 사는 화가다. 복잡하고 모호한 걸 질색하는 그의 성정대로 삶과 꿈과 예술이 일체인 것이다. 그처럼 그의 그림에는 깨끗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이 있다. 순수에의 열망, 아름다움에의 열망, 사랑에의 열망이 빚어낸 색채들이 이현 고유의 담대한 구성으로, 그러나 섬세한 손길로 태어난 정물, 그리고 풍경 들. 나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이현 그림을 보면 피로가 가신다. 삶이 어지럽고 도무지 모든 게 역겹기만 할 때, 그래서 내가 둔하고 멍해져 있을 때, 이현 그림을 보면 마음이 평화롭게 씻긴다. 그린(green) 바탕에 흰 덩어리들, 그레이(grey) 바탕에 붉은 덩어리 두 개. 새로 선보이는 이현의 정물화, ‘흰 양귀비’와 ‘붉은 양귀비’다. 형상은 있는 둥 마는 둥, 색면들로 화면이 꽉 차 있는데, 미세하게 꽃가루가 솟아나는 듯하다. “사물을 오직 색의 콘트라스트로 형상화해 봤다.” 이현이 현악기 못지않게 드럼을 좋아한다는 게 생각난다. 마치 타악기를 연주하듯이 색깔만 유지한 채 농도, 채도, 명도를 달리 하면서 신나게 놀았구나. 그렇게 색의 놀이로 탄생한 거대한 꽃! 콘트라스트란 ‘대비되는 것의 화합’이다. (일상에서도 이현은 모든 부조리, 불협화음, 불화를 질색한다). 대비되는 색깔들로 화합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배려(감각과 감수성!)와 수고가 필요할까. 오직 색채로 사물의 세계를 향해 가는 여정, 톤을 달리 하는 그 숱한 붓질들. 몸이 영혼을 따르는지 영혼이 몸을 따르는지 몽롱할 그 노동! 좋은 화가란 붓질을 호흡처럼 여기는 사람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극기에 가깝게 성실하리라. 그건 그렇고, 이현은 새 작업 테마로 왜 양귀비꽃을 택했을까? ‘흰 양귀비’와 ‘붉은 양귀비’는 정물일까? 클로즈업된 풍경 아닐까? 아니, 정물도 아니고 풍경도 아니다. 그것은 추상이다. 구상의 탈을 쓴 추상. 꽃은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꽃이다. 정밀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나 한편 꽃은 얼마나 추상적인가? 가령 구름은 본디 정해진 형체가 없어서 추상화하기가 힘들 테다. 내 이런 저런 생각에 이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한다. “구상과 추상이 다를 바 없다” 새로 작업한 이현 그림들은 멀리서 보면 색깔(색면의 대비)만 보인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뭔가 미세한 게 꿈틀거린다. 색깔 속에서 꿈이 형상을 이루듯 느른하게, 이윽고 사물의 형체가 드러난다. 제 기원(基源) 속의 생명처럼! 이현 그림이 확실히, 어딘가 달라졌다. 나는 그 변화가 반갑다. 여전히 색채는 눈부시지만, 거기 그늘이랄까, 깊이가 더해졌다. 나는 정물을 빨아들이고, 풍경에는 빨려들어 간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다가 이현이 “속마음을 들키는 것 같아 부끄럽다.”했는데, 그 그림이 뭐였지? 나는 바닷가 양귀비꽃 만발한 들판의 마을, 양귀비꽃처럼 붉은 지붕을 인 하얀 집들을 본다. 눈 쌓인 숲속 흰 나목들이 가냘프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검은 밤의 레몬 빛 초승달을 본다. 바닷가 눈밭과 노란 아침노을이 걸린 수평선을 본다. 검은 땅과 푸른 하늘을 꿰매고 있는, 바늘처럼 가느다란 나무들을 본다. ‘생의 예감’들을 본다. “저, 이 풍경들은 너한테 어떤 의미야?” 이런 질문을 하다니! 화가한테 내가 “이 그림은 내게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라고 해야 옳을 테다만, 이현은 선뜻 대답해준다.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리워할 풍경들이라고. ‘이 세상의 무엇이 그리울까, 내가 그리워할 게 뭘까’를 떠올려봤다고. 이현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묻어난다. ‘생의 예감’이 다음 생에서 기억할 이번 생이라니, ‘생의 기억’이라고 해도 되겠다. 혹은 ‘기억의 예감’, ‘미리 그리워하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큰 이유는, 이 세상을 아주 두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리라. 그리울 풍경들, 거기에는 이현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으리. 그러니까 이현의 낙원!
‘방랑’! 아, 저 광막한, 무한 파랑! 파랑의 우주, 파랑의 시작과 끝! 나는 자맥질해 들어간다. 아니, 빨려들어 간다! 억겁의 공기와 빛이 이룬 깊은 파랑. 그 속의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중일까? 뼈를 던져도 재를 뿌려도 살이 차오르고 숨이 돌아올 것 같은 파랑! 바닥도 없고 꼭대기도 없는 천공(天空)! 수만 리를 나는 새처럼 끝없는 반복과 변주와 공들임, 화가의 파들거리는 붓! 천공의 심포니 속에 작은 음표 같은 한 인간의 저 황홀한 외로움! 그 무한히 넓은 색면, 공간 속에서 한 인간이 어렴풋이 보인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마라. 그는 거기에 있다! 화가 이현은! 제 성취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끝없이, 제 스스로 생성되고 확장되는 깊은 파랑 숨결 속에서. 화폭 밖으로도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천공! 두 달을 쉬지 않고, 공기와 빛처럼 얇디얇은 파랑을 칠하고 또 칠하고 칠했다지. 무념무상 몰아경지로 수십 번, 수 백 번 덧칠해서 거대한, 그러나 단 하나의 깊은 파랑을 낳았다! 숭고한 노동의 결실이다. 하지만 땀방울 하나 보이지 않고 마치 저절로 그리 생긴 듯, 원래 있었던 듯, 한 세계가 거기 아름다이 있다. 저 그림을 갖고 싶다! 저 우주를 훔치고 싶다! 이현! ‘방랑’을 그린 게 너니? 부럽고도 자랑스럽다! - 황인숙 -
|